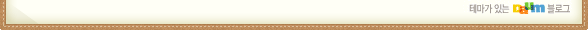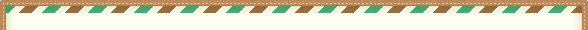
부석사를 향하여 우중을 무릅쓰고 천천히 주위 경관을 즐기며 차를 몬다.
경북의 북단으로 강원도가 가까우면서도 산세가 험하지 않고 낮은 산이 줄지어 나타난다.
어디서나 산사의 초입에는 요란한 민박,특산물,산채나물전문 식당 간판이 즐비하다.
신식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어 시원스럽다.
부석사 입구의 일주문은 보수공사가 한창이다.
본사의 몇채도 중건 또는 신축공사가 진행 중으로 조금 어수선하게 손님을 맞는다.
부석사의 첫인상은 이름에도 나타나듯이 돌을 너무 많이 활용(?)한 절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야말로 돌이 떠다니는 그런 분위기가 물씬한다. 돌은 변성암 질의 반정斑晶이 박혀 있는 변성암으로 풍화가 완전히 진행되면 굵은 마사토로 변하는 암석이 기반암으로 절을 받히고 있다.
옹벽이나 계단이 온통 호박돌의 오십배이상의 크기로 된 방괴석으로 구축되어있다.
전체적으로 절집의 앉은 자세가 ,,,옹벽이나 돌계단의 경사가 웅대하게 가파르다.
부석사에는 우리나라의 최고最古의 목조 건축물인 무량수전이 위치하고 있어 절의 역사성이나 품위를 지켜주고 있다. 절의 경계를 알리는 당간 지주의 예술성도 손꼽히는 문화재이고 무량수전 앞의 석등은 흔치 않은 단아함이 깃든 예술품임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게 한다.
특히 땅바닥에 놓여있는 연꽃부조석물은 요사이 연꽃에 관심을 가진 이후로 눈길을 끄는 작품이었다. 부석사도 마찬가지로 대웅전 앞의 진입 돌계단 경사는 장난이 아니게 급하여 오르려는 사람의 자만심과 번잡스러워하려는 힘을 단번에 빼버린다. 헥헥거리면서 걸어 올라 숨을 돌리면 그때서야 대웅전의 헌액이 눈에 들어온다. 잡인의 용심이 빠진 조금은 순수해진 손님을 우람한 대웅전은 내려다보면서 맞는다. 스님의 낮은 바리톤 음성의 독경소리와 간헐적으로 따라 외우는 불자 아낙네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 깊은 경배의 감정이 서리게 한다.
거기에 더하여 살짝 비바람이 들이치니 풍경소리까지 더해져 들린다.
살며시 대웅전 문을 열고 들여다 보니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아낙네 대여섯과 여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 두서넛이 정신없이 경배의 절을 올리는 모습이 보인다. 스님 독경소리는 녹음기인가???
대웅전 뒷산의 기반암이 노출된 벼랑에는 석불 셋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빗물에 거무스레한 빛이 엄숙하게 반사되고 있다.
그리고 좌우의 석불 표정은 그 엄숙함을 단번에 깨뜨려 버리는,, 상대방을 어이없게 만드는 억지의 미소를 보여 주고있다.
우산을 한 손에 받쳐 들고 사진을 찍으려니 디카가 빗방울에 자주 젖는다.
그냥 보이는 대로 샷을 하니 불편함은 없어지고 너무 쉽게 촬영되니 그림을 포착하는 신중함이나 경지에 이르여는 집요함이 덜하고 그 자리에 경솔함이나 가벼움이 대신 차지하는 것 같아 조금은 착잡해진다. 마치 공사 준공사진을 무차별로 박아 내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없다.
부석사를 뒤로하여 산을 내려오니 단체관광객이 투명한 비닐 비옷을 입고 한 삐까리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 입구의 당간 지주대에서는 문화재 답사의 우두머리인 듯한 굵직한 양반이 당간 지주대의 역사성과 예술적 가치를 설명한다고 열심이다.
아침 겸 점심을 열한 시쯤에 그곳의 식당에서 청국장과 순두부를 간장 양념하여 마신 후 다음 목적지로 향하면서 안 해가 대뜸 질문을 던진다.
"부석사 하고 봉정사 하고 둘 중에서 어느 절에서 살래 하고 누가 물으면 당신은 어느 쪽?"
"그야 당근 봉정 사지"
"나도,,,"
0 사진을 그야말로 가볍게 많이 찍었다. 파이의 문화재 사진 다음에는 그것을 설명하는 설명문을 바로 뒤에 찍어 올려두었다. 확대하시면 내용을 읽으실 수 있다.
파이 서비스가 종료되어
더이상 콘텐츠를 노출 할 수 없습니다.